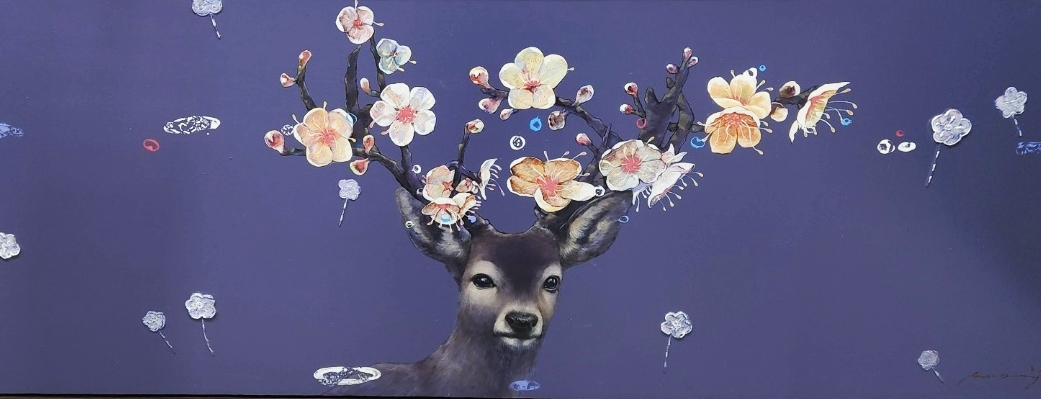박목월 朴木月 (1916. 1. 6 ∼ 1978. 3. 24)
◆약력
▦1916년 경남 고성 출생. 본명 영종(泳鍾) ▦대구 계성중 졸업 ▦1939년 <문장>에 정지용 추천으로 등단 ▦1946년 조지훈, 박두진과 합동시집 <청록집> 출간 ▦1954년 첫 개인시집 <산도화> 출간 ▦1961년 한양대 교수 임용 ▦1965년 예술원 회원에 선임 ▦1978년 별세 ▦시집 <경상도 가랑잎> <사력질> <무순> 등 ▦자유문학상, 국민훈장 모란장 등 수상
문예지 《문장(文章)》에 시가 추천됨으로써 시단에 등장하였다. 1953년 홍익(弘益)대학 조교수, 1961년 한양(漢陽)대학 부교수, 1963년 교수가 되었다. 1965년 대한민국 예술원(藝術院) 회원에 선임되었고, 1968년 한국시인협희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1973년 시전문지 《심상(心像)》의 발행인이 되었다.
1976년 한양대학교 문리과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자유문학상 ·5월문예상 ·서울시문화상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받았다. 저서에 《문학의 기술(技術)》 《실용문장대백과(實用文章大百科)》 등이 있고, 시집에 《청록집(靑鹿集)》(3인시) 《경상도가랑잎》 《사력질(砂礫質)》 《무순(無順)》 등이 있으며, 수필집으로 《구름의 서정시》 《밤에 쓴 인생론(人生論)》 등이 있다.
◆ 작품해설
박목월은 일제말기에서 해방기로 넘어가는 어두운 현대사가 배출한 빼어난 서정시인이다.
해방 후에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이 함께 펴낸 시집 <청록집>은 흔히 암흑기라고 이야기되는 1940년대 전반기가 결코 블랙홀과 같은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청록집>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무덤의 별이라면 이 가운데서도 박목월의 시편들은 가장 외로우면서도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록파 3인은 모두 일제말기에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지를 통해서 문단에 나온 시인들이다. 문학사적으로나 시편들 하나하나의 문학성 면에서 세 사람이 모두 값어치 높은 시인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시 전문잡지 <심상>을 창간하여 <문장>의 동양주의, 조선주의를 한국 현대시의 주류로 만들어 나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빼어난 시편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간 박목월의 가치는 특별히 주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는 간결한 언어, 넓은 여백, 함축적인 리듬의 활용을 통해 형식 미학이 단순히 형태상의 기교가 아니라 정신과 가치의 문제임을 입증해 나간, 정지용 이래 가장 중요한 시인의 한 사람이다.
<청록집>에 실린 ‘임’이라는 시에서 목월은 그 자신을 ‘내ㅅ사 애달픈 꿈꾸는 사람’ ‘내ㅅ사 어리석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었다. <청록집>에서 목월은 캄캄한 어둠의 힘에 휘감기지 않은 ‘애달프고 어리석은’ 꿈의 세계를 숨 막히도록 절제된 언어와 리듬의 형식미에 실어 보여주었다. 우리는 ‘윤사월’ ‘삼월’ ‘청노루’ ‘나그네’ 같은 시들에서 탁류와 같은 현실의 힘에 위축되지 않은 목월의 정결한 마음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목월의 대표작인 ‘나그네’는 ‘목월에게’라는 부제가 붙여진 조지훈의 ‘완화삼’이라는 시에 대한 화답의 뜻으로 씌어진 것이다. 이 시에는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목월은 ‘나그네’를 쓰면서 바로 이 구절을 부제로 삼음으로써 지훈에 대한 깊은 우정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흔히 행운유수로 표상되는 그 자신의 독특한 삶의 태도를 신비스러운 상징의 차원 위에 구축해 놓고 있다.
우리는 이 시에서 외로움과 도취가 공존하는, 한 개체적 인간의 완미한 내면세계를 목도하게 된다. 이 개체적 인간은 현실의 위압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다.
구름 위를 가는 달처럼 표표하게 그 자신의 내면적 자유를 향유하면서 남도 삼백 리를 떠도는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보면 대일협력에 빠지지 않고 역사의 어둠을 슬기롭게 건너간 조지훈과 박목월의 정신의 고도를 가진 사람이고, 인간학적인 면에서 보면 세속잡사에 연루되지 않고 내면적 자유를 향유하면서 ‘자기’라는 이름의 운명을 의연히 감당해 나가는 기품의 소유자다.
■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목련꽃 그늘 아래서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어린 무지개 계절아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질 쓰노라
클로버 피는 언덕에서 휘파람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깊은 산골 나무 아래서
별을 보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어린 무지개 계절아
질 곱은 나무에는 자주 빛 연륜이
몇 차례나 몇 차례나 감기었다.
새벽 꿈이나 달 그림자처럼
젊음과 보람이 멀리 간 뒤
...... 나는 자라서 늙었다.
마치 세월도 사랑도
그것은 애달픈 연륜이다.
길처럼
머언 산 구비구비 돌아갔기로
山산구비마다 구비마다
절로 슬픔은 일어 ……
뵈일 듯 말듯한 산길
산울림 멀리 울려나가다
산울림 홀로 돌아나가다
……어쩐지 어쩐지 울음이 돌고
생각처럼 그리움처럼 ……
길은 실낱 같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무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에 그들은 떼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와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좀 여유가 있는 지금, 양손을 들고
나머지 허락받은 것을 돌려보냈으면
여유 있는 하직은
얼마나 아름다우랴.
한 포기 난을 기르듯
애석하게 버린 것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가지를 뻗고,
그리고 섭섭한 뜻이
스스로 꽃망울을 이루어
아아
먼 곳에서 그윽히 향기를
머금고 싶다.
송화(松花) 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 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고
엿듣고 있다.
머언 산 청운사(靑雲寺)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고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고 살아라 한다.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구름처럼 살아라 한다.
바람처럼 살아라 한다.
관(棺)을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알아보고
형(兄)님!
불렀다.
오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하고 소리가 들리는 세상.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깐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십 구문 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 삼(六文三)의 코가 납짝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십 구문 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 구문 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산도화 1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사는것이 온통 어려움 인데
세상에 괴로움이 좀 많으랴
사는 것이 온통 괴로움인데
그럴수록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 서로가 돕고 산다면
보살피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왜 괴로우랴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정다운 눈과
건너보고 마주보고 바로보고 산다면
아침마다 동트는 새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어려운 일 돕고 살자 마음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素朴)하게 점잖은
촌 잔칫날 팔모상(床)에 올라
새 사돈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저문 봄날 해질 무렵에
허전한 마음이
마음을 달래는
쓸쓸한 식욕이 꿈꾸는 음식
또한 인생의 참뜻을 짐작한 자(者)의
너그럽고 넉넉한
눈물이 갈구(渴求)하는 쓸쓸한 식성(食性)
桃花 가지
경주군 내동면(慶州郡 內東面)
挑花 가지
참으로 남을 돕는 일이
흰 달빛
자하문
달 안개
물 소리
대웅전
큰 보살
바람 소리
솔 소리
범영루
뜬 그림자
흐는히
젖는데
흰 달빛
자하문
바람 소리
물 소리
병원으로 가는 긴 우회로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님의 유품은
그것 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가 헐어 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 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소리
글을 썼다
새벽 세 時
시장기가 든다
연필을 깎아 낸 마른 향나무
고독한 향기,
불을 끄니
아아
높이 靑과일 같은 달.
2
겨우 끝맺음.
넘버를 매긴다.
마흔 다섯 장의
散文(흩날리는 글발)
이천 원에 이백원이 부족한
초췌한 나의 분신들.
아내는 앓고……
지쳐 쓰러진 萬年筆의
너무나 엄숙한
臥身.
3.
사륵사륵
설탕이 녹는다.
그 정결한 投身
그 고독한 溶解
아아
深夜의 커피
暗褐色 深淵을
혼자
마신다.
대수롭지 않게
스쳐가는 듯한 말씨로써
가슴을 쩡 울리게 하는
그런 詩,
읽고 나면
아, 그런가부다 하고
지내쳤다가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번쩍 떠오르는
그런 詩,
투박하고
어수룩하고
은근하면서
슬기로운
그런 詩
슬며시
하늘 한자락이
바다에 적셔지 듯한,
푸나무와
푸나무 사이의
싱그러운
그것 같은
밤 늦게 돌아오는 길에
문득 쳐다보는,
갈라진 구름 틈서리로
밤하늘의
눈동자 같은
그런 詩.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카드에
눈이 왔다.
유리창을 동그랗게 문질러 놓고
오누이가
기다린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ㅡ 네 개의 샛파란 눈동자.
ㅡ 네 개의 샛파란 눈동자.
참말로 눈이 왔다.
유리창을 동그랗게 문질러 놓고
오누이가
기다린다, 누굴 기다릴까.
ㅡ 네 개의 까만 눈동자.
ㅡ 네 개의 까만 눈동자.
그런 날에
외딴집 굴뚝에는
감실감실 금빛 연기,
감실감실 보랏빛 연기,
ㅡ 메리 크리스마스
ㅡ 메리 크리스마스
한탄조 - 박목월(朴木月)
아즈바님
잔 드이소.
환갑이 낼모랜데
남녀가 어디 있고
상하가 어딨는기요.
분별없이 살아도
허물될 게 없심더.
냇사 치마를 둘렀지만
아즈바님께
술 한 잔 못 권할 게
뭔기요.
북망산 휘오휘오 가고 보면
그것도 한이구머.
아즈바님
내 술 한 잔 드이소.
*
보게 자네,
내 말 들어 보랭이,
자식도 품안에 자식이고
내외도
이부자리 안에 내외지.
야무지게 산들
뾰죽할 거 없고
덤덤하게 살아도
밑질 거 없데이.
니
주머니 든든하면
날
술 한 잔 받아 주고
내
돈 있으면
니 한 잔 또 사 주고
너요 내요 그럴 게 뭐꼬.
거믈거믈 서산에 해 지면
자넨들
지고 갈래, 안고 갈래.
*
시절은 절로
복사꽃도 피고
시절이 좋으면
풍년이 들고
이 사람아 안 그런가.
해 저무는 산을 보면
괜히
눈물 글썽거려지고
오래 살다 보면 살 맛도 덤덤하고
다 그런기라.
박목월 朴木月 (1916. 1. 6 ∼ 1978. 3. 24)
문예지 《문장(文章)》에 시가 추천됨으로써 시단에 등장하였다. 1953년 홍익(弘益)대학 조교수, 1961년 한양(漢陽)대학 부교수, 1963년 교수가 되었다. 1965년 대한민국 예술원(藝術院) 회원에 선임되었고, 1968년 한국시인협희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1973년 시전문지 《심상(心像)》의 발행인이 되었다.
1976년 한양대학교 문리과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자유문학상 ·5월문예상 ·서울시문화상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받았다. 저서에 《문학의 기술(技術)》 《실용문장대백과(實用文章大百科)》 등이 있고, 시집에 《청록집(靑鹿集)》(3인시) 《경상도가랑잎》 《사력질(砂礫質)》 《무순(無順)》 등이 있으며, 수필집으로 《구름의 서정시》 《밤에 쓴 인생론(人生論)》 등이 있다.